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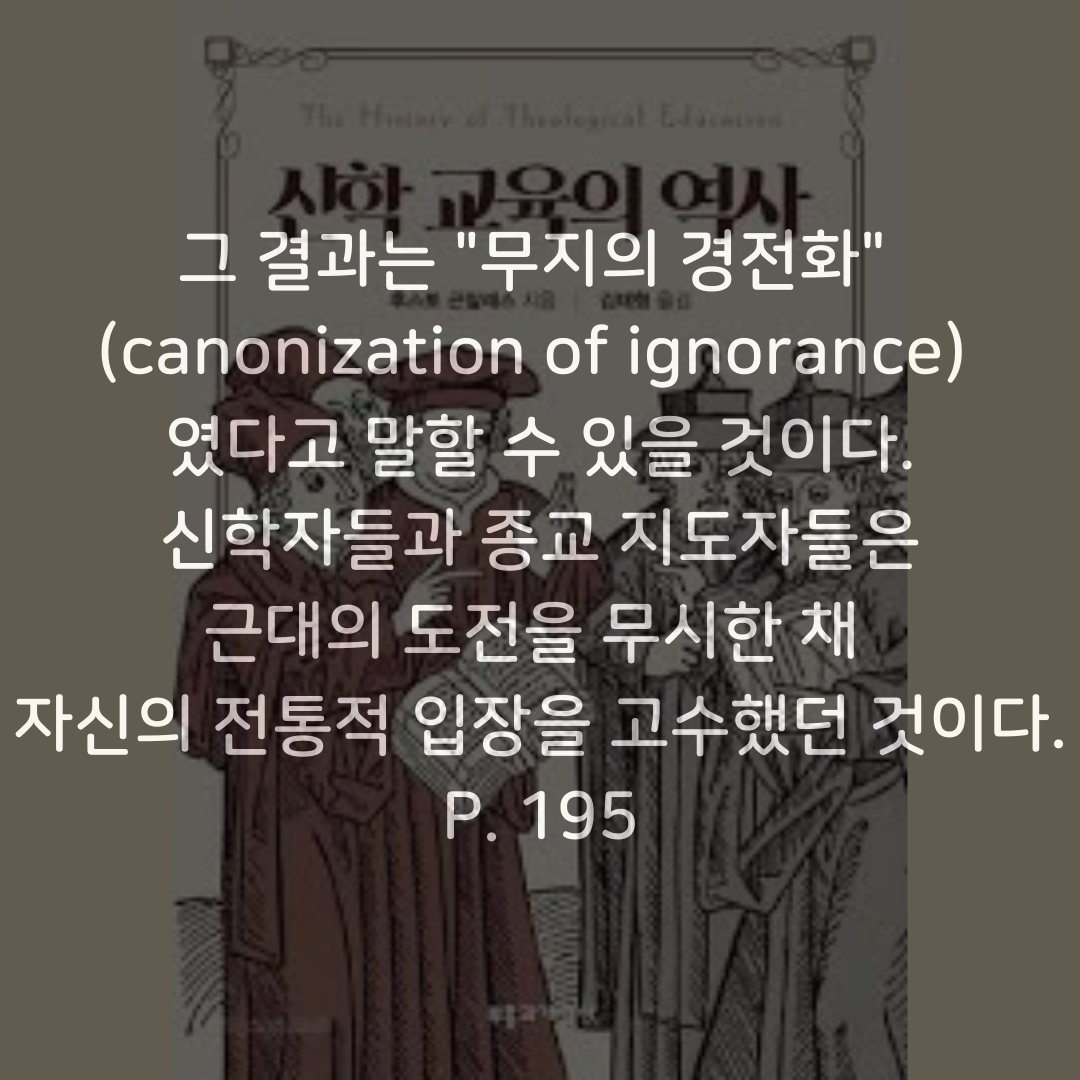

최근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신학 교육의 역사와 대학의 역사를 읽었다. 대학의 역사는 한밭도서관 자료실을 뒤적이다 발견해서 무심코 집어들었다. 대학의 역사는 말 그대로 중세부터 탄생한 유럽의 대학 역사를 차례대로 살펴봤다. 대학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하고, 특정 시기에는 어떤 대학들의 정책이나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는지 설명한다. 아무 생각없이 집어들었는데 3가지 측면에서 감탄하면서 읽었다. 첫번째는 서구에서 인문학이 왜 그토록 강조되었는지 보여주고, 두번째로는 스콜라철학, 계몽주의, 19-20세기의 과학의 발전 등 시대마다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보여주고, 세번째로는 현대의 대학들의 전통, 관습, 구조와 시스템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2주 정도 후에 읽은 신학 교육의 역사는 후스토 곤잘레스가 썼는데, 몇년 전 특강으로 했던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했다고 한다. 신학 교육의 역사라서 11-12세기의 중세 대학부터 출발하지 않고 1세기경의 신학 교육부터 출발하면서 시대 별로 차례대로 다루고 있다. 200쪽 가량이다보니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각 시대마다 공통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곤잘레스는 이 책을 통해서 과거와 신학교육이 가졌던 역사,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우리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짚어보려고 한듯 하다.
곤잘레스가 보여주는 신학교육은 역사적으로 크게 5가지의 흐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1) 1-10세기경 고대부터 중세까지 대학 엘리트 교육이 탄생하기 전의 시기
2) 11-15세기경 중세부터 근대 직전까지 스콜라철학이 지배하던 시기
3) 15세기 이후 종교개혁과 고전어(헬라어, 히브리어)의 재발견
4) 18세기 근대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전 이후의 신학교육
5) 20세기 연구중심 대학 출연 이후의 신학교육
각 시기마다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지만 현시대까지도 관통하는 특징은 2가지다. 첫번째는 학문과 신앙 사이의 간극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 두번째는 사상과 신학보다 당대의 환경과 배경이 교육을 바꿔놓는다는 것이다.
학문과 신앙 사이의 간극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신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했고, 이로 인해서 신자와 성직자의 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로마제국이 무너지자 상황은 더욱 급변하여서 수도원과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전환되었으나 모든 성직자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성직자들은 고대와 중세 시기에 문맹이었다. 우리가 아는 교부들이나 중세의 신학자들은 상당한 특권층이었다.
성직자들도 문맹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학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개혁 시기 이후까지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종교개혁 전후, 15세기 경부터 동로마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중세에 잊혀졌던 여러 그리스, 히브리문학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중세의 서유럽은 라틴어와 스콜라철학이 중심이 되는 시기였고,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그리스, 히브리 문헌은 서유럽에서 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 문헌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대학과 신학교들이 라틴어에 더해서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고 여러 문헌들을 읽는 인문교육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잔재가 근대까지 남아서 한동안 대학의 인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고전어들을 배우고 고전문학을 읽는 것이었다. 현재의 신학교에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이것도 15세기 경부터 유행한 인문교육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신학교육도 앞서 말한 1) 학문과 신앙의 갈등, 2) 당대의 환경과 배경의 변화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신학 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학문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본주의자들은 근현대 학문의 발전을 무시하고, 누군가는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을 무시한다. 한편 한국과 같은 비서구권 교회들은 서구의 신학교육을 큰 비판이나 반성없이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
'📚책 리뷰 및 소개 > 📙신학 책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기홍, 크리스천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교회사를 읽고 (0) | 2021.12.15 |
|---|
